지금은 자동차교통이 철도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철도를 피해 기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으로 도로를 놓아 자동차 전용의 교통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는 기차에 붙어먹고 사는 기생자동차에 불과했다. 이유는 물동량과 행객들의 교류가 전국적이 아니라 도시중심으로 교류하였고 경제와 기술의 낙후로 자동차전용 도로 닦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의 대동맥 역할을 철도가 담당했다는 뜻이다.
이래서 일제시대의 자동차 운수업은 전국의 기차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발달에 불과 했다. 1920년대 후반부터 뻗어 나간 1급 국도도 대부분 부설하기 쉬운 철도변을 따라 전국으로 이어진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따라서 자동차는 기차가 수송한 승객과 화물을 인근 지역으로, 인근 지역에서 행객과 화물을 기차에 전달하는 기차의 보조수단이었다.

우리나라가 현대적인 교통혁명을 일으킨 것은 1899년 5월 서울 서대문과 청량리 간에 등장한 전차가 그 시발점이 된다. 이어 4개월 후인 9월에는 대량 수송수단인 기차가 처음으로 경인간에 나타나면서 1905년에는 경부선이, 1906년에는 경의선이, 1914년에는 호남선과 경원선이, 1928년에는 함경선이 각 각 개통되어 1960년대 말 고속도로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나라 현대교통의 주역을 기차가 담당했다.
철도가 없던 시절, 부산에서 서울, 신의주에서 서울이나 청진에서 서울까지 도보로 15일 이상 걸리던 거리가 기차가 등장하면서 7~10시간이면 서울에 도착할 수 있어 육로교통의 혁명을 일으켰다.
일제시대에 개통됐던 모든 간선 철도들은 총독부의 철도국에서 관장하여 일본의 배만 불려주었다. 그런데 철도를 놓아 가면서 승객과 화물을 기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각 곳으로 연계시켜주는 문제가 골치 거리였다. 기차가 역마다 내려놓은 승객과 화물이 인근 목적지까지 가는데 많은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기차의 인기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짜낸 아이디어가 자동차를 투입하여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이래서 우선 물동량이나 승객이 많은 역에다가 1915년부터 철도국에서 버스나 트럭을 투입하기 시작해 철도자동차가 탄생했다. 그런데 시내교통이 원활한 서울, 평양, 부산 등 대도시보다 지방 도시부터 시작했다.

“예 간난아, 너 땡 잡았다.”
“무언데 그리 호들갑이냐 또‘”
“너 애간장 태우던 서울 간 낭군님 만나러 읍내 기차역까지 60리길 타달타달 걸어가지 않아도 편히 기차 타게 생겼다.”
“아이 이것아 개벽이라도 났냐, 무슨 넋두리가 그리도 기냐.”
“우리 마을에도 거 뭐냐 한꺼번에 사람 많이 태우는 노리아이(버스)가 아참 저녁 하루에 두 번씩 들어 와 기차역으로 냅다 달린다는 구나.”
이렇게 철도국 직속의 철도자동차가 각 역마다 생겨나자 재력이 있는 민간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기차의 수송량을 한정된 철도국 자동차가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자 민영 철도부속 자동차 영업이 1916년부터 각 지방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논밭을 팔아 한, 두 대의 자동차를 도입하여 역과 인근 마을사이의 화객수송을 연계하는 철도자동차시대가 개막됐다. 이래서 초기에는 철도기생자동차 신세로 지방의 자동차 영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민영 자동차영업이 발달하여 철도국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자 호황을 누리는 민영 노선마다 차례로 수탈하여 철도국으로 편입시키는 바람에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1928년에는 최초로 순수 민간업자 보호단체인 조선자동차협회가 생겨났다.
전영선 소장 kacime@kornet.net <보이는 자동차 미디어, 탑라이더(www.top-rid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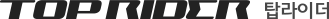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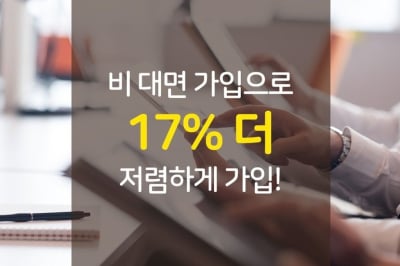















![[시승기] 푸조 3008 GT, 실연비 20km/ℓ..이쁘고 경제적](https://www.kod.es/data/trd/image/2025/10/31/trd20251031000001.122x80.0.jpg)
![[시승기] 아이오닉6N, 믿기지 않는 완성도의 스포츠카](https://www.kod.es/data/trd/image/2025/10/29/trd20251029000001.122x80.0.jpg)
![[시승기] 볼보 ES90, 이상적인 시트포지션과 승차감 구현](https://www.kod.es/data/trd/image/2025/10/23/trd20251023000001.122x80.0.jpg)
![[시승기] 기아 EV5, 패밀리 전기 SUV의 새로운 스탠다드](https://www.kod.es/data/trd/image/2025/09/24/trd20250924000001.122x80.0.jpg)
![[시승기] 쏘렌토 하이브리드, 5천만원에 모든 것을 담았다](https://www.kod.es/data/trd/image/2025/09/15/trd20250915000001.122x80.0.jpg)



